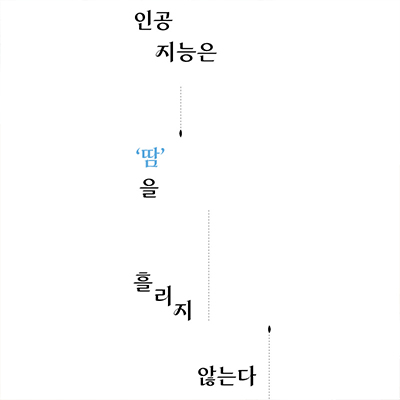“여름은 동사의 계절
뻗고, 자라고, 흐르고, 번지고, 솟는다.”
얼마 전 광화문 교보문고에 갔다가 본 광화문 글판의 문구는 참신했다. 여름을 맞아 새로 단장한 광화문글판의 문구는 이재무 시인의 시 「나는 여름이 좋다」의 마지막 두 행에서 따왔다.
자동사 계열 동사들의 리드미컬한 행렬이 잘 보여주듯이, 스스로 역동적으로 운동하며 열매를 맺어가는 여름의 이미지를 잘 포착했다.
여름이라는 말은 ‘열매[實]’에서 유래했다. 열매는 여름이라는 자기 단련의 시간을 제대로 갖지 않으면 과실(果實)로서 숙성될 수 없다. 자기 단련의 시간이 의미하는 실체적 이미지와 상징이 곧 ‘땀’으로 표상된다는 점은 말할 나위 없다. 그러므로 땀은 명사가 아니라 자동사일 때 진실한 의미를 갖는다. 동사 예찬론자인 이재무 시인이 어느 시에서 “명사에는 진실이 없다 / 진실은 동사로 이루어진다”(「동사를 위하여」)라고 쓴 것을 보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땀이라는 가치는 좋은 노동(good work)의 분비물로서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다. 예를 들어 백무산 시인은 시집 『만국의 노동자여』(1988)에 수록된 시 「노동의 밥」에서 “피가 도는 밥을 먹으리라 / 펄펄 살아 튀는 밥을 먹으리라”라고 썼다. 밥에서 ‘피’를 연상할 만큼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노동자의 현실을 고발한 작품이었다. 백무산의 시는 특히 1987년 유월항쟁 이후 이어진 노동자 대투쟁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저 김소월이 그토록 염원했던 ‘옷과 밥과 자유’가 아직도 여전히 이 땅에서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환기한다.
땀은 소중하다. 하지만 땀을 경멸하고 혐오하는 사회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 소설가 알베르 카뮈가 “노동을 하지 않으면 삶은 부패한다. 그러나 영혼 없는 노동을 하면 삶은 질식되어 죽어간다”고 주장한 것은 정직히 땀 흘리며 일하는 ‘좋은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육체노동(Labour)을 혐오하고 멸시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좀처럼 바뀌지 않았고, 최근에는 인류학자 데이비드 그레이버가 2013년 처음 유포한 용어인 ‘불쉿잡(Bullshit Jobs, 가짜노동)’의 양태가 전 세계적으로 더욱 기승을 부린다. 그레이버는 불쉿잡의 대표 사례로 사모펀드 CEO, 광고 조사원, 보험 설계사, 텔레마케터, 집행관, 법률 컨설턴트 같은 직업군을 꼽았다. 그리고 교사, 간호사, 쓰레기 수거 요원, 음악가, 항만 노동자, 정비공… 들이 한꺼번에 사라진 세상이야말로 ‘재앙’일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몸을 쓰며 땀을 흘리는 노동이야말로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 노동(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회·문화적 분위기는 더욱 가속화의 길을 가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이 주도하는 디지털 문화는 기술이 경험을 대체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경험의 멸종’을 초래할 우려를 낳는다. 미국 역사학자 크리스틴 로젠은 『경험의 멸종』(2024)에서 “이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는 개인이 아닌 사용자다”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우리의 직접 경험을 앗아가면서 오로지 ‘매끄러움’을 추구하는 문화로 획일화되었다고 경고한다.
땀을 경멸하고, 경험이 멸종되는 시대는 결국 예술의 위기이고, 예술교육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위기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은 이제 윤동주의 「별 헤는 밤」 같은 시를 읽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어느 전직 국어교사는 “선생님, 저희는 서울에서 나고 자라서 하늘에 그렇게 별이 총총한 걸 본 적이 없어요”라고 반응하는 아이들을 소개한다. 우리는 모두 시인으로 태어나고, 예술가로 태어나지만, 디지털 기술이 주도하는 경험의 멸종 사태는 인간 내면을 정서적 사막으로 만든다. 인간 정서의 사막이 바로 자연의 사막을 만들어 낸다는 빌헬름 라이히의 사막화 과정에 관한 연구 결과는 이런 시대일수록 ‘야생성(wildness)’의 가치가 더 중요해졌다는 점을 환기한다. 예술과 예술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손’을 쓸 줄 알아야 한다. 우리 삶에서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가 부활해야 한다. 실제 아이들은 교육 현장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 ‘창의는 시체’라고 서슴없이 말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시켜서 하는 활동’이라는 뜻이다. 어쩌면 아이들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활동을 ‘당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이른바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땀을 전혀 흘리지 않는 삶을 생각하는 한, 내적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다시, 땀을 흘려야 한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미디어가 재현하는 ‘편집된’ 야생 프로그램들을 그저 소비하는 것으로 만족해할 게 아니라, 실제(the real)의 세계를 향해 발걸음을 떼야 한다. 그리고 진짜 ‘삽질’을 하며 땀을 흘려야 한다. 손의 사용법을 되찾아야 한다. 머리로 아는 가짜 앎이 아니라 손과 몸을 직접 사용하며 ‘할 줄 앎’을 터득해야 한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인 윤동주 시인의 시 「별 헤는 밤」에는 시인 프란시스 잠이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그가 쓴 「위대한 것은 인간의 일들이니」라는 작품은 무엇이 우리 삶에서 ‘위대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시에 등장하는 온갖 노동 행위들은 누가 ‘시켜서’ 하는 타율적 노동이 아니라 내가 ‘내켜서’ 하는 자율노동이다. 정직히 땀을 흘리고, 흘린 땀에 대해 정당히 보상하는 사회가 좋은 삶이고 좋은 사회일 것이다. 시의 행간에서 진하게 풍기는 구수한 땀 냄새가 그립다. 거듭 강조하지만, 인공 지능은 땀을 흘리지 않는다.
나무 병에 우유를 담는 일
꼿꼿하고 살갗을 찌르는 밀 이삭들을 따는 일
암소들을 신선한 오리나무 옆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일
숲의 자작나무를 베는 일
경쾌하게 흘러가는 시내 옆에서
버들가지를 꼬는 일
어두운 벽난로와 옴 오른 늙은 고양이와
잠든 티티새와 즐겁게 노는 어린아이들
옆에서
낡은 구두를 수선하는 일
한밤중에 귀뚜라미들이 날카롭게 울 때
쳐지는 소리를 내며 베틀을 짜는 일
빵을 만들고 포도주를 만드는 일
정원에 양배추와 마늘의 씨앗을 뿌리는 일
그리고 따뜻한 달걀을 거두어들이는 일
프랑시스 잠(Francis Jammes)
「위대한 것은 인간의 일들이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