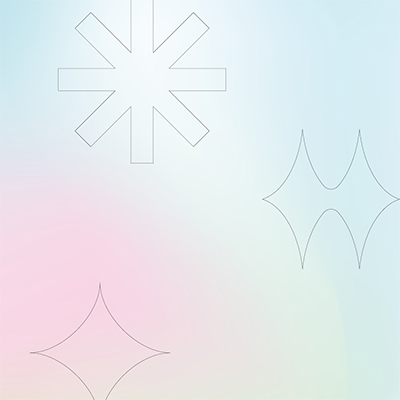조선의 대문호 연암 박지원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곤충의 더듬이나 꽃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도무지 문심(文心)이 없다고 할 것이다.”(不屑於蟲鬚花蘂者, 都無文心矣.)(연암집7 「종북소선자서」) 그는 또 그의 『열하일기』, 미지의 대륙으로 향하는 대장정의 경계(압록강)에서 “도(道)란 다른 데서 찾을 게 아니라, 곧 물과 언덕의 제(際)에 있다.(道不他求, 卽在其際)”라고 하였다. ‘제’는 사이나 경계를 의미한다. 예술적 ‘감’ 혹은 ‘감각’에 대한 우리의 탐색은 아마도 연암의 이 두 마디 사이를 떠돌 듯하다.
우리의 삶이란 세계, 혹은 타자와의 끊임없는 만남의 과정이다. 그 만남의 가장 원초적인 사건이 ‘감’, 혹은 ‘느낌(feel)’이다.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주체와 객체, 몸과 세계가 공유하는 존재론적 직물이 있다. 그것을 그는 ‘살(flesh)’이라고 하였다. ‘느낌’은 나와 세계가 만나는 원초적인 사건이며, ‘살’ 속에서 일어나는 살아있는 접촉이다. 이 접촉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떨림이 ‘감각(sensation)’일 것이다. 그러나 또한 생각해 보면, 살아간다는 것이란 그 생생한 실존의 느낌과 감각에 점차 익숙해지고 어느덧 무뎌지는 과정이기도 하지 않은가. 천천히 모든 것이 습관적인 것이 되어가면서, 그리하여 나의 것이 아닌, 심지어 무엇인가에 의해 조직된 방식에 따라 느끼고, 보고, 듣게 되는 것이다. 나의 삶으로부터 나는 소외되어 간다.
예술의 정의가 이것이다 라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 얼마나 있을까? ‘반-예술’과 ‘예술의 죽음’이라는 부고장이 남발되는 시대에 누가 무엇을 단언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만은 분명한 듯하다. 예술이 굳어진 우리의 느낌과 감각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것 말이다. 어쩌면, 아마 어쩌면 이것이 예술의 전부일지도 모른다. 구원이니, 영혼이니, 순수니, 사회, 역사라고 하는 고상하기 이를 데 없는 거품들을 싹 거둬낸다면 말이다. 이건 무슨 순수한 예술 같은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들뢰즈는 베이컨의 회화를 해명하는 명저, 『감각의 논리』에서 예술이 감각을 재현에서 해방시켜 순수한 힘으로써 우리에게 강렬한 감성적·육체적 체험을 선사한다고 하였다. 재현에서 해방시킨다는 말은 베이컨의 회화가 추상도 아니지만 재현도 넘어서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겠지만, 우리는 ‘재현’이란 말을 ‘습관화되고 (누군가에 의해) 코드화된 감각’이란 말로 바꾸어 놓아도 될 듯하다. 습관과 코드에서 해방된 감각은 순수한 생명의 힘이 된다.
그런데 예술은 어떻게 습관과 코드에서 해방되는가? 그리하여 느낌과 감각을 다시 생생한 생명의 힘으로 약동하게 만드는가? 그것은 예술은, 위대한 예술은 우리를 경계에 서게 만들기 때문이다. 경계에 선다는 것은 전위가 된다는 것이다. 김수영의 유명한 에세이 「시여, 침을 뱉어라」를 다시 읽어보자. 어쩌면 살짝 오독이라도 해 보자. “시를 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다음 시를 못 쓰게 된다. 다음 시를 쓰기 위해서는 여직까지의 시에 대한 사변을 모조리 파산을 시켜야 한다. (중략) 시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하는 것이다.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온몸으로 동시에 밀고 나가는 것이다.” 김수영의 ‘온몸’이 무엇일까? 아마 그것은 발가벗은 현존, 생생한 실존의 느낌이지 않을까. 자신을 지도해 줄 사변도, 익숙한 관습도, 코드도 없는 미지의 경계 앞에 선 시인의 ‘느낌’ 그것이 ‘온몸’이지 않을까. 그 자리를 우리는 전위라고 한다. 김수영 시인은 시를 쓸 때마다 시인은 항상 새로운 전위에 서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롭지만 혼자인 자리다. 그래서 그는 “자유는 고독한 것이다.”라고 말한다. 온몸으로 전위에 선 자의 탄식이리라.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김수영의 전위는 연암의 ‘경계(사이)’와 다르지 않다. 연암은 관습적 삶을 떠나 저 미지의 세계를 향하는 경계(강)에서 외쳤다. 도는 경계에 있다고. 이는 미지의 세계 앞에 선 ‘온몸’의 외침이며 ‘살’의 떨림이다. 경계에 설 때, 익숙한 것들은 사라진다. 낯선 것들 앞에 우리의 느낌과 감각은 예민해지고, 생생해지고, 강력해진다. 그때 우리는 ‘곤충의 더듬이’나 ‘꽃술’에 닿을 수 있게 된다. 그곳은 관습적 감각이 지나치는 자리다. 촉기가 선, 섬세한 감각, 생생한 날 것의 감각이 닿는 자리다. ‘문심’, 예술의 느낌이 열리는 자리이다. 예술은 이제 생생한 생명의 힘으로 약동하게 된다. 경계에 설 때 우리의 굳어진 느낌과 감각은 다시 활기를 띠고 다시 설레기 시작한다.
그리고 예술의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랑시에르는 『감성의 분할』에서 감각적 세계가 정치적 질서에 의해 조직되고 분할된다고 보았다. 그것은 “누가 세계를 인식할 권리가 있는가?”라는 정치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감각은 그 권력에 의해 코드화되어 있다. 연암의 경계와 김수영의 온몸은 바로 이 지점과 첨예하게 부딪친다. 경계에 선 온몸은 기존의 권력에 의해 조직된 감각의 질서에 의문을 제기하고 거부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느낌과 감각을 ‘결정 불가능한 지대’(들뢰즈)로 되돌려서 새롭게 재구성하고자 한다. 감각의 지평을 바꾸고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하고 들리지 않던 소리를 들리게 한다. 그것은 실로 매우 정치적이기도 한 것이다. 가장 감각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이다.
예술은, 그 정의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종말을 맞이했던 생명연장 장치를 달든 말든 간에, 그것은 몸 전체가 세계와 상호 감응하는 장을 새롭게 연다. 그리고 그 장을 항상 살아 있고 생생하게 만든다. 우리로 하여금 감춰진 고통을 체감하게 하고, 그리고 곤충의 더듬이와 꽃술의 아름다움을 실감하게 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체험하게 하지 않겠는가.
경계에서 온몸으로 밀고 나가고 있는 모든 예술가들에게 경의를!